23 Apr 김재현 개인전 <질문의 형상들>
질문의 형상들
김재현은 질문들을 그린다. 질문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글도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지금 이 글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유는 그 자체로 질문들의 연쇄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질문들이 되는 까닭은, 질문에 딱 들어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순간에 사유는 오히려 그 작동을 멈추기 때문이다. 결코 어딘가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며 또 다른 질문을 낳는 질문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인다. 그리고 질문들은 보통 이렇게 글쓰기나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살얼음판 같은 상징 위에서 최대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살금살금 낱말들을 골라 나가는 행위이다.
그러나 김재현은 이미지를 생산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질문들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순간 여기에 마침표를 찍을까 물음표를 찍을까 고민했다. 사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의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는 ‘.’에 구부러진 선을 하나 더 그려 넣은, 그 정해진 의미가 다른 기호이다. 하지만 지금의 맥락에서 그 둘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다. 문자 기호는 부유하는 의미들을 정박시키기 위한 형상임에도 이런 미묘함이 발생한다. 놓여있는 자리에 따라 같은 기호도 다른 의미로 작동할 때가 있다. 기호에서 의미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어떠한 관계 속에 자리하고, 또 옮겨 다닌다.
이미지 역시 부유하는 의미들이 내려앉을 표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의 체계보다도 훨씬 미끄럽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형상들은 계속해서 잘못 보이고, 엇나가고, 미끄러진다. 김재현의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해보자. 여기 매달린 천에 검은 얼룩들이 있다. 비교적 묽은 물감으로 얼룩진 두 덩이의 형상이 가운데에 보인다.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그 형상은 금세 두 손이 된다. 그것은 어떻게 손이 되었을까? 절대적으로 손의 형상과 닮아있기 때문일까? 김재현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손이나 분절된 신체로 볼 수 있는 형상들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형상들은 서로 닮지 않았다. 아예 다른 방식의 그리기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미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형상들을 어떠한 의미로 읽어낸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눈에 보이는 모호한 형상들을 수렴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화면 밖에서 주어지는 설명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형상으로 보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미지 속에 있는 각각의 형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따지는 문제는 이미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단순히 그것의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지의 핵심은 오히려 그 안쪽에서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형상이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새가 되고,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쉽게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항상 관계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의 그림에서도 가까스로 정박한 형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시 붓질의 흔적 속으로 숨어버리곤 한다.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얼굴 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화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점들은 빛나는 눈구멍으로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추상적인 얼룩으로 다시 녹아든다. 화면 앞쪽 날카로운 고리의 형상들도 살을 꿰뚫는 감각을 주다가 이내 붓 자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미지와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유하여 또 다시, 질문의 형상들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화면을 메운 온갖 형상들 중에서 언어로 구조화되는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대부분의 형상들은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형상과 의미들을 모두 다 붙여버린 다음에도 잉여의 시니피앙은 항상 남는다. 기호 작용의 주이상스가 그곳에 있다.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기호작용을 넘어선다. 예술 작업으로서의 이미지는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방식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은 닮음과 닮지 않음,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 사이의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를 통해 그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질문이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재현이 질문으로서의 그림을 그리며 떠올렸다는 금강경을 생각한다. 그 신비로운 텍스트에서 석가모니와 수보리는 질문을 주고 받으며 진리로 나아간다. 석가모니는 명료한 답을 주기보다는 선문답처럼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오른 부처이기 때문일까. 사실 석가모니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분석의 언어를 빌리면 그가 대타자의 자리에 있기에 전체 의미의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대타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욕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적 진리의 결론이 ‘공(空)’에 가닿는 것은 흥미로운 공명을 만든다.
의미의 자리는 비어 있다. 질문하는 자가 그곳에 욕망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의미는 작동한다. 김재현의 그림 속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비어있는 표면들을 모더니즘 페인팅의 물질성이나, 그의 전공이 동양 미술이라는 맥락에서 읽어내는 방식보다는 그림을 보는 이들의 욕망이 투사되는 스크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 의미도 읽어낼 수 없는 공간을 통해 형상은 드러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 금강경이 신비로운 텍스트로 작동하는 이유도 의미 작용이 일어나는 이야기 부분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옴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같은 진언들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에 있다. 우리는 비어있는 것과 채워져 있는 것 ‘사이에서’ 본다. 이미지는 그 사이의 틈에서 솟아난다. 형상들, 형상이 아닌 것들, 질문들, 질문의 형상들, 그리고 이미지들.
글 / 권태현 (미술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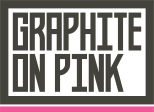






Sorry, the comment form is closed at this time.